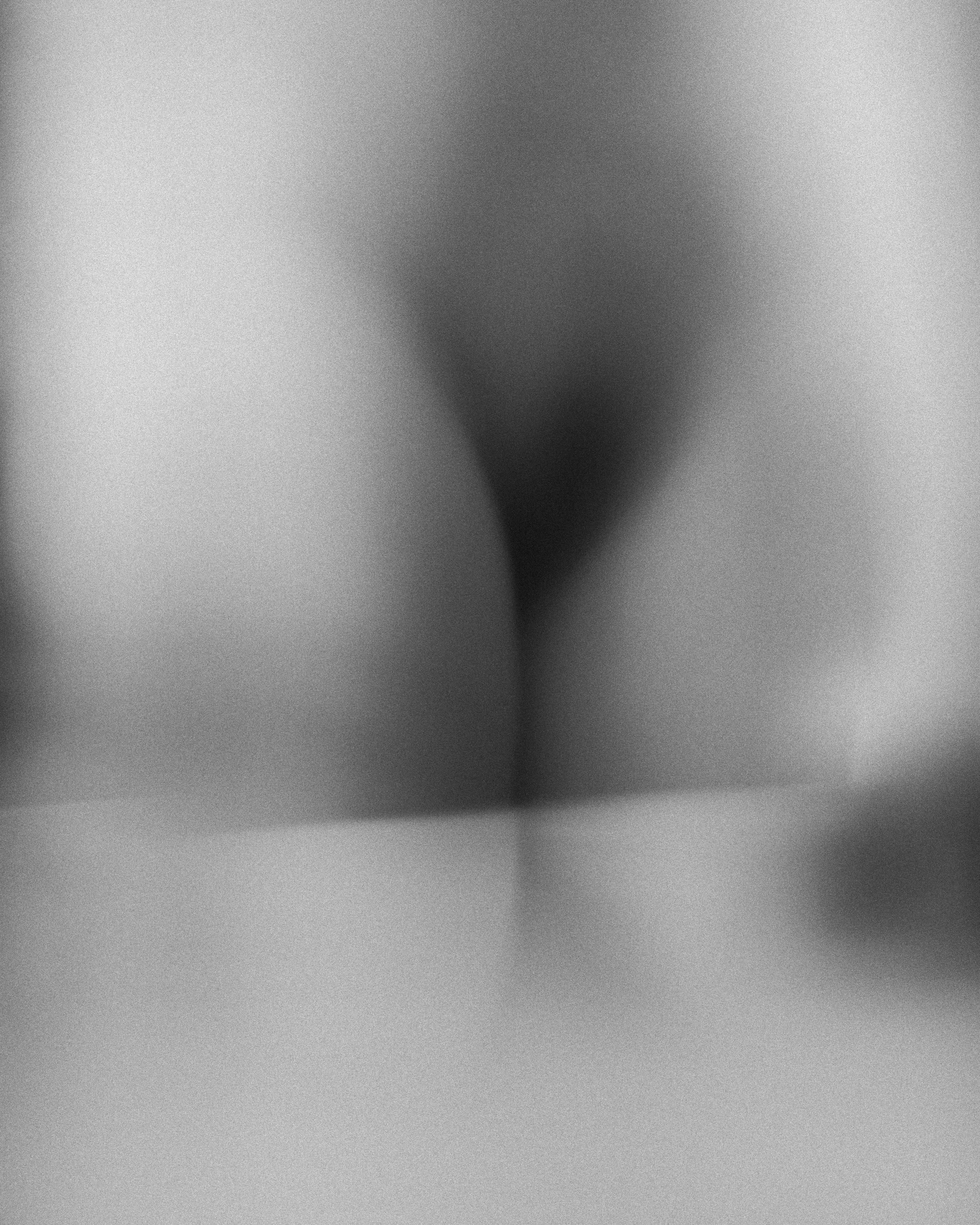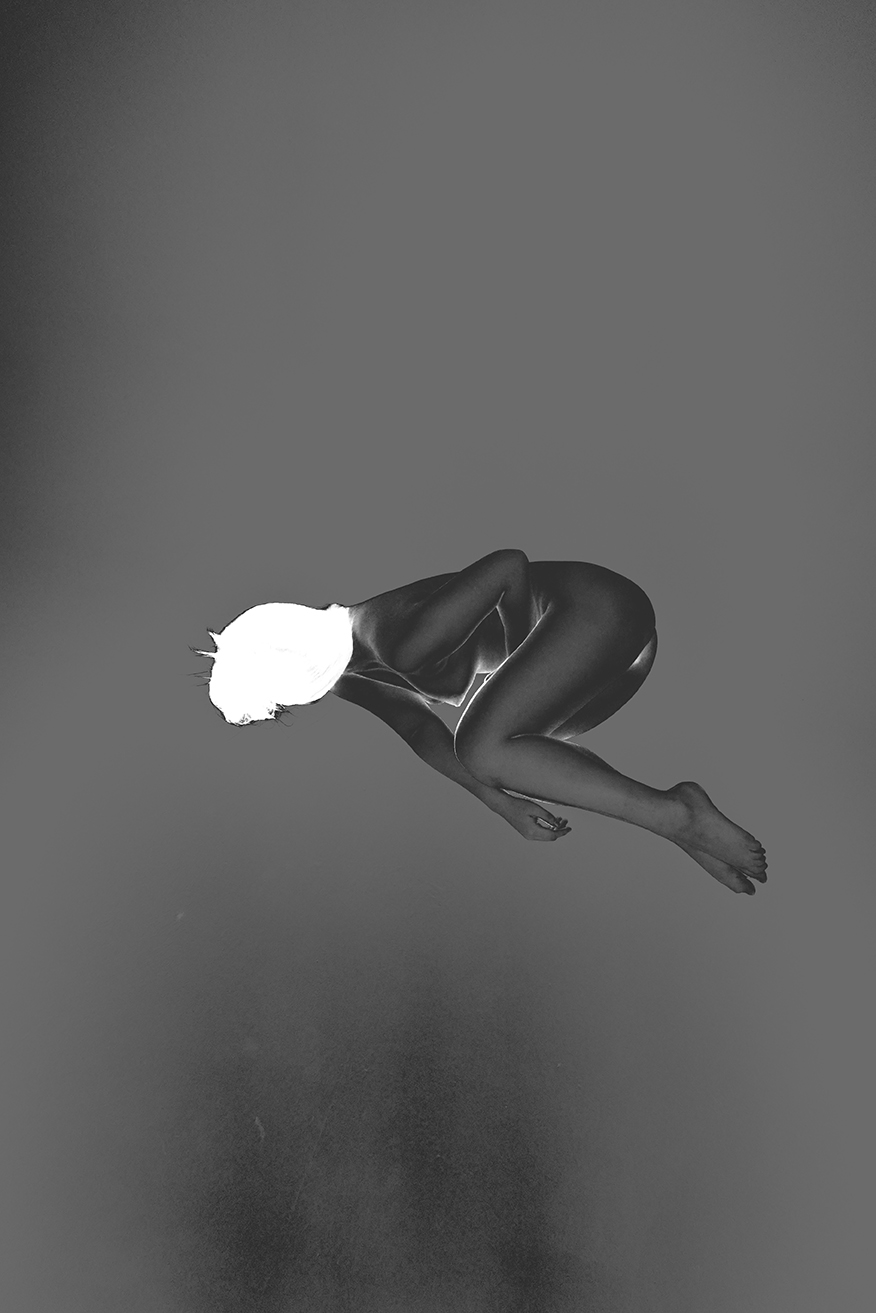













욕망에 젖은 삶과
욕망이 다 사라져버린 삶
나는 어느 쪽을 원하는가?
때로 사람들은
욕망에 빠져 있을 때보다
욕망 없이 사는 삶을 견디지 못하는 듯 보인다.
사라지지 않는 욕망의 광기 속에서만이
오로지 생기 있는 삶이 존재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것은 욕망보다 어쩌면 권태인지 모른다.
욕망이 사라지고 나면 권태 속에 잠식되고,
마치 삶은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 마모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과 사랑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욕망이 활개 칠 때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욕망도 사라지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은 빠르게 사라진다.
욕망을 붙들고 마치 욕망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살던 순간들이
지푸라기를 잡았다 스러지듯이 허망해진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삶과 사랑을 지속하는 것이다.
사실 권태는 욕망이 사라진 그 무엇이 아니라,
사라진 욕망에 대한 또 다른 욕망이다.
그래서 욕망과 권태는 하나의 두 얼굴 같다.
그래서 삶과 사랑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 있다.
삶과 사랑은 욕망이나 권태가 아니며
그 사이의 그 무엇이다.
삶과 사랑이 그러하듯이,
욕망과 권태는 긍정과 부정이 아니다.
그 사이의 무엇이다.
그래서 삶은 차라리 연민이다.
그래서 사랑은 차라리 견딤이다.
삶과 사랑을 지속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연민과
돌아서 버린 차가운 말 없는 오랜 외면을
역시 말없이 겪어내는 일이다.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욕망에 젖은 삶인가?
아니면 욕망이 다 사라져버린 삶인가?
분명한 귀결은
그 어느 쪽이라 해도
나는 여전히 욕망에 젖은 삶 속에서 있다는 사실이다.